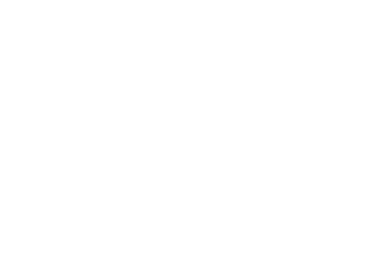안미숙시인의 詩 비오는 날 외 4편

안미숙시인의 약력
경남 산청 출생
경남 산청 거주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조부문 당선
비오는 날
처서도 한참 지난 마당에
긴 장마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靑靑한 회화나무 잎들이
아직은 9월이라고 견딜만 하다고
꼿꼿이 두 눈 부릅뜨고
안부를 전해오는 가을 어스름
거치른 돌 담벼락 앞에 서 있는 방아꽃은
아침나절부터 보랏빛 입술로 떨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죠? 아직 견딜만한 거죠?
이제야 꽃으로 핀 당신도, 나란 사람도
견뎌야 할 어떤 무거운 죄값이 있어
이 세상 귀퉁이에 묶여있는 걸까요
물길 열린 하늘에서 젖은 마음들이
회초리 하나씩 들고 쏟아져 내립니다
회화나무의 돌멩이 같은 젊은 결기가
가냘픈 방아꽃 피멍 들어가는 인내가
상처난 부리로 꿈을 쪼아대던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내 작은 열망이
젖은 매질을 고스란히 다 맞고 나서야
핏물 번지듯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나서야 껴안는 것들은 저절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가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의 환자복을 갈아입힌다
변두리라 불리우는
어느 지방의 작은 도시
오래된 병원 입원실에서
꽃가루같이 분분히 떨어져 내리는
늙은 육신의 비늘
군데군데 지워져 버린 선사시대의 벽화처럼
아버지의 지워진 기억들도 몸 바깥으로 빠져나와
부우연 먼지들 속에 아무렇게나 뒤섞여
흩날리고 있는 것만 같은데
아버지는 굽은 등을
더욱 동그랗게 구부리고 돌아앉아 자꾸 우신다
편편이 부서져 버린 모래알 같은 기억들을
눈물로 복구할 수 있을까
아버지 없이 살아서 평생이 신산스러웠다던
산골 아낙의 막내아들은
다섯 남매의 투박스런 젊은 아비가 되어
“내 인자 집에 갈란다”
엉거주춤 일어서려다 말고 오도카니
침대 옆구리에 주저앉아
유리알 같은 설움을 뚝뚝 흘리시는데
나는 살굿빛 석양이 이불처럼 내려와 덮이는
오래된 병원 입원실에서
아버지의 젖은 얼굴을 닦아 드린다
한 번은 놓아 주어야 할 고달픈 손이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눈을 붙이는 저녁이다
어머니
꽃잎이
여린 꽃잎 한 장이
무거운 물방울
덜덜 떨며
받치고 서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를 받쳐 들고
안간힘으로
서 있었나요?
저 여린 꽃잎처럼.
갯벌
밀물 빠져나간 내 몸은
모두 길이 된다
숨구멍을 파고 힘겹게 걸어 다니는
회색빛 다족류와
어느 쪽이든 옆으로 걸어야만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와
진흙으로 목욕을 즐기려는 망둥어도
온몸을 밀며 가는 길
저마다의 다른 발로
같은 땅을 밟으며 지나가는 길
천지 사방 짠바람 불어와도
고즈넉한 내 몸속의 길
내 몸 위에 찍히는 고즈넉한 발자국들
부치지 못한 편지
나는 앉아서 늙어만 가요, 나도
당신처럼, 앉아서 늙어가고 싶네요
당신과 내가 서로 모르는 곳에서 늙어가듯이
나는 지금 바쁘네요. 당신, 지금도 앉아 있나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처럼, 잠들지 못하는 밤에도 내일의
새벽을 걱정하지 않는 늙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어둠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어디론가 나 있는
내가 걸어 온, 먼 우주의 그 길을 더듬더듬 천천히
당신처럼, 되짚어가면서 늙어가고 싶다는
그때가, 오늘 같은 날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시 한 줄에 당신을 건너다보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떠나 온 영혼의 대합실
불꽃에서 불꽃이 그 불꽃이 무수한 불꽃으로
황홀했던 정거장, 당신도 그곳에 있었을까요?
한 생애의 육신을 빌리기 위해 저만치 거리를 두고
당신과 내가 비켜서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나는 앉아서 늙어만 가요. 당신은 오래된
전생의 속삭임처럼 그렇게 나를 불러 세워요
다음 생을 건너가는 은하수 같은 눈빛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