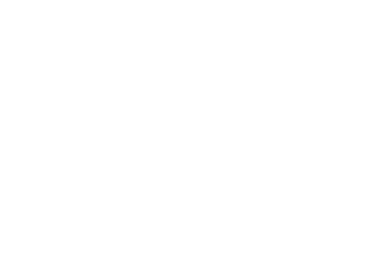원도이시인의 詩 속보 외 4편

원도이시인 약력
강원도 횡성 출생, 2019《시인동네》로 활동
시집 『비로소 내가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2010 농촌문학상, 현상동인, 선경문학상운영위원
속보
희고 투명한 비들
주룩주룩 공중뿐인 세상을 얇게 저민다
나는 유리 안쪽에서 비를 보고 있다
벽과 창틀에 비가 꽂힐 때마다 툭툭 물꽃이 피어난다
순간에 사라지고 순간에 피어나며
세상은 젖는다
잠 속으로 빗소리 들어온다
(물총을 빠져나온 물이 치이익 칙, 등짝으로 뺨으로 쏟아진다 그때 너는 누군가의 깜찍한 놀이였어)
번쩍 천둥이다 속보다
물꽃들이 도시를 덮었다고 계단 저 아래까지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수북하다고 끝내 반지하의 어떤 생을 덮치고 말았다고
나는 다시 유리 안쪽의 잠에 빠진다
(물놀이 버스가 흔들리고 물병 속에서 우린 출렁거렸지 지금 도착하는 비는 물총과 물병에서 언제쯤 나와 도랑이 되고 강물이 되고……)
……물꽃이 된 걸까
대체 몇 생이 지난 걸까
반지하까지
방울토마토
급정거다
버스 안의 것들 급히 쏠린다
한 방향이다
방울토마토가 먼저 쭈르 떽떼구르
순식간에 당구알 바닥이다
느닷없는 판타지다
어머머, 웬일이야 여자가 판타지 속으로 뛰어든다
발 디딤판 아래에서 기우뚱 몇 알
펄럭이는 치마 밑에서 덥석 몇 알
덜컥대는 좌석에 엎드려 몇 알
주울 때마다 토마토는 킬킬거리며 쓰리쿠션이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낼름거린다
신발코에 머리를 박는다
엉겁결에 터진다 멱살 잡힌다
어떤 놈은 죽어라 뒷자리까지 마라톤이다
검은 봉지에서 재채기처럼 튀어나온 방향들이
빨강을 칠하다가 길을 만들다가 사라지다가
사방에서 딸랑거리다가
가는 둥 마는 둥 시간을 흔들어대다가
다시 검은 봉지에 갇혀서
‘무지개마을 3단지입니다’
환승
상자의 목적지는 나였을까
그는 가슴에 주소를 붙이고 테이프에 온몸이 감긴 채 나를 쳐다본다
각을 지키려다 그랬을까
모서리 한쪽이 찌그러져 있다
나는 면도칼로 함구와 밀봉을 연다
그가 품은 것은 공룡알 열 개와 비닐 뽁뽁이, 언제 내가 주문한 것인가 주소가 길을 잃은 것인가
목걸이 주소를 걸고 집을 잃은 아버지처럼 그는 우두커니 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어디여야 하나 생각에 젖은 듯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택배 기사에게 전화하는 일
아, 그래요, 현관 앞에 내놓으세요
나는 공룡알이 든 상자를 현관 밖에 둔다
그렇게 낯선 문 앞에 오래 서 계셨을 아. 버. 지.
그리움이란 수많은 정글을 헤쳐가다 이렇게 뜬금없는 존재로 눈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저녁이 보라색으로 짙어가고 공기가 회색빛으로 무섭게 바뀌고 있다
그는 그의 정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그는 거기 그냥, 있었다
피사의 사탑
진짜 탑이 기울어졌어
쑥덕거리며 사람들이 몰려온다
한 손으로 두 손으로 민다
아저씨가 할머니가 유모차가 민다
잦아드는 오후를 기울어지는 햇살을 나의 우주를 민다
나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위쪽만을 향하고 있는데
맨 아래층 기둥 15개와 그 위로 6개의 층마다 30개의 기둥이 꼿꼿한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데 정수리에 달린 종들은 여전히 맑은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그대들은 내가 기울어졌다고 근심하는가
나는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고 장대처럼 건들거리지도 않았고 비구름을 쪼개지도 않았고 지구처럼 23.5도나 기울어져 빙빙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대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있을 뿐인데
날마다 지평선 밖으로 달리는 해를 보고 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땅 속이 궁금할 뿐인데
기울어진 것들
기울어지는 것들
기울어지고 싶은 것들과 나란히
조금은 삐딱하게 조금은 위태롭게 조금은 짜릿하게
비스듬히, 그러나 똑바로
비로소 내가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불임상담실은 어둡다
늙은 의사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누군가에게 내민다
‘이 날에 숙제를 꼭 하세요’
나는 볼펜의 방향을 따라 미끄러지다가 숫자에 앉아서 빤히 쳐다본다
그때 나는 의사의 목소리를 집어타고 누군가의 귓바퀴를 맴맴 돌다 달팽이관을 지나 대뇌로 도착하기까지의 긴 여행을 즐기다가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없는 채로 세상은 널려있었고
샤워하는 머리칼에서 떨어져 하수구의 어둡고 좁은 틈바구니를 지나 탄천으로 흘러갔고 잉어가 나를 삼키고 나는 잉어를 빠져나오고, 그때 나는 첫봄의 물빛도 비린내도 아니었고 생각도 아니었고 거친 목소리도 아니었고 서랍 속 제습제는 더욱 아니었고
말하자면 그때, 나는 단지 마시고 식탁에 놓아둔 컵의 빈 공간
어느 날 숙제를 하는 누군가가 맹렬히 나를 부른다
숫자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것이 물크러진 토마토 같은 것이 땅을 뚫고 나오는 아지랑이 같은 것이 이리와, 이리와, 이리 좀 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천둥벽력 같은 것이 내 실핏줄을 달려와서는 없는 귀를 쑤시고 없는 눈을 찌르고 없는 입술을 빨고 없는 코에서 킁킁대고
문득 나는 멱살 잡혀 끌려가고
사과가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것처럼 돌려놔도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초침처럼
비로소 나는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괄호는 나를 담기 시작할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