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석 시인의 시 벋어쓰기 외 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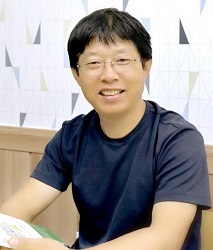
임영석 시인
1961년 충남 금산 출생.
1985년 계간 『현대시조』 봄호 천료 등단.
시집으로 『받아쓰기』외 5권, 시조집 『꽃불』외 2권,
시조선집 『고양이 걸음』, 시론집 『미래를 개척하는 시인』이 있고,
제1회 시조세계문학상, 제15회 천상병귀천문학상 우수상을 받았고,
2019년 강원문학상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기금 외 강원문화재단 3회,
원주문화재단2회 창작기금 받음
받아쓰기
내가 아무리 받아쓰기를 잘 해도
그것은 상식의 선을 넘지 않는다
백일홍을 받아쓴다고
백일홍 꽃을 다 받아쓰는 것은 아니다
사랑을 받아쓴다고
사랑을 모두 받아쓰는 것은 아니다
받아쓴다는 것은
말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일 뿐,
나는 말의 참뜻을 받아쓰지 못한다
나무며 풀, 꽃들이 받아쓰는 햇빛의 말
각각 다르게 받아써도
저마다 똑같은 말만 받아쓰고 있다
만일,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불러주고
아이들이 각각 다른 말을 받아쓴다면
선생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햇빛의 참말을 받아쓰는 나무며 풀, 꽃들을 보며
나이 오십에 나도 받아쓰기 공부를 다시 한다
환히 들여다보이는 말 말고
받침 하나 넣고 빼는 말 말고
모과나무가 받아쓴 모과 향처럼
살구나무가 받아쓴 살구 맛처럼
그런 말을 배워 받아쓰고 싶다
계간 『시에』2010년 가을호 발표
어둠을 묶어야 별이 뜬다
거미는 밤마다 어둠을 끌어다가
나뭇가지에 묶는다 하루 이틀
묶어 본 솜씨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어둠을 묶어 놓겠다고
거미줄을 풀어 나뭇가지에 묶는다
어둠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나뭇가지가 휘어져도
그 휘어진 나뭇가지에 어둠을 또 묶는다
묶인 어둠 속에서 별들이 떠오른다
거미가 어둠을 꽁꽁 묶어 놓아야
그 어둠 속으로 별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거미가 수천 년 동안 어둠을 묶어 온 사연만큼
나뭇가지가 남쪽으로 늘어져 있는 사연이
궁금해졌다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따뜻한 남쪽으로 별들이 떠오르게
너무 많은 어둠을 남쪽으로만 묶었던
거미의 습관 때문에 나무도 남쪽으로만
나뭇가지를 키워 왔는가 보다 이젠 모든 것이
혼자서도 어둠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수천 년 동안 거미가 가르친
어둠을 묶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리라
거미는 어둠을 묶어야 별이 뜨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나 보다
임영석 시집 『어둠을 묶어야 별이 뜬다 』에서
엉덩이를 빌리다
엉덩이가 때로는 손이 될 때가 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유리문을 밀고 나갈 때
발은 땅에, 손은 무거운 짐에 묶여 있으니
화장실이나 가서 내밀던 엉덩이를 빌린다
그런데 지난봄, 매화나무 가지마다
하얀 봉우리를 눈꽃처럼 가득 피어 놓을 때
그때도 엉덩이를 빌려 피웠는지
남쪽으로 뻗은 가지가 더 많은 꽃을 피웠다
아무래도 북쪽의 나뭇가지는 매화나무의
엉덩이였기 때문에 꽃망울을 잡지 않고
봄의 문을 밀고 들어섰던 엉덩이였나 보다
양손에 꽃망울을 움켜잡았던 매화나무나
짐을 들고 있는 내 모습에서
엉덩이 빌리는 것은 마찬가진데
어찌하여 난 엉덩이에 구린내만 나고
매화나무 엉덩이는 꽃샘추위를 녹여 꽃을 피워내는가
꽃 같은 세상 만들겠다는 매화나무의 굳은 의지가
매화나무 엉덩이에 굳은살로 가득 배겨있으니
앉지도 서지도 않고, 평생 제 고집의 한 자세로
손과 발을 대신하겠다는 엉덩이의 다짐,
왠지 어정쩡한데 그 자세가 편해 보인다
작자 미상의 모든 매화도(梅花圖) 손과 발을 쓸 수 없어서
그 시절 엉덩이를 들이밀었던 그림 아닐까
임영석 시집 『받아쓰기』에서
참새
참새는 제가 살 집은 짓지 않는다
집을 지어도 제 새끼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마지막 지붕은 제 몸을 얹어 완성한다
제 새끼에게 어미의 온기만 주겠다는 것이다
머리 위 은하수 별빛을 맘대로 바라보고
포롱 포로롱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주고 있다
참새는 제 자식에게 다른 욕망은 가르치지 않는다
제 몸을 얹어 집을 완성하는 지극한 사랑
그 하나만 짹짹짹 가르치고 있다
임영석 시집 『고래 발자국』에서
치악산을 오르며
애초, 저 산은 누군가의 평평한 등이었을 것이다
닳고 헐어서 무거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골이 깊게 패어서도 나무를 등에 업고
다시 누군가의 평평한 등이 되겠다는 자세다.
10년 넘게 살았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보니
평평한 내 등도 골이 깊게 패어져 있었나 보다
나도 저 산처럼 골이 깊게 파일 때마다
메아리 울리는 숲을 가꾸며 그 나무의 등이 되었는지.
이제는 치악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눈물이 난다
내 가시 같은 발길을 돌려보내지 않고
천 길 물속 같은 고요를 먹고사는 나뭇잎이
물고기 떼처럼 헤엄쳐 내 아픈 상처를 덮는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름다운 골짜기마다
기암괴석이 하얀 뼈처럼 드러나 있다
저 치악산 기암괴석도 누군가와 결별을 하고
이(齒)를 악물고 버티어 낸 다짐들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으면
소리치는 그 소리를 메아리로 되돌려줄까
누군가 따뜻한 등이 되어 평생을 산다는 것은
평생 땀 흘려 오르는 산과도 같은 것인가 보다
임영석 시집 『어둠을 묶어야 별이 뜬다』에서
고래 발자국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고래들의 발자국을 보고 싶다
고래가 발을 버리고 왜 지느러미를 갖게 되었는지
무슨 아픔이 있어 바다로 몸을 숨겼는지
발자국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릴 것만 같다
새끼를 낳고 젖을 물리는 고래들의 발자국을
고고학자들은 왜 아무도 찾지 않을까
바닷속 어딘가는 두 발로 혹은 네 발로 걷던
발자국 무덤들이 가득히 있을 것인데
수천 년 동안 고래 발자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역사(歷史)를 발로 쓰고 다닐 때
고래들은 천 리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바닷속 가득 풀어놓고 낙엽처럼 밟고 다녔을 것이다
그 발자국 따라 오늘도 새우떼를 쫓을 것이다
임영석 시집 『고래 발자국』에서